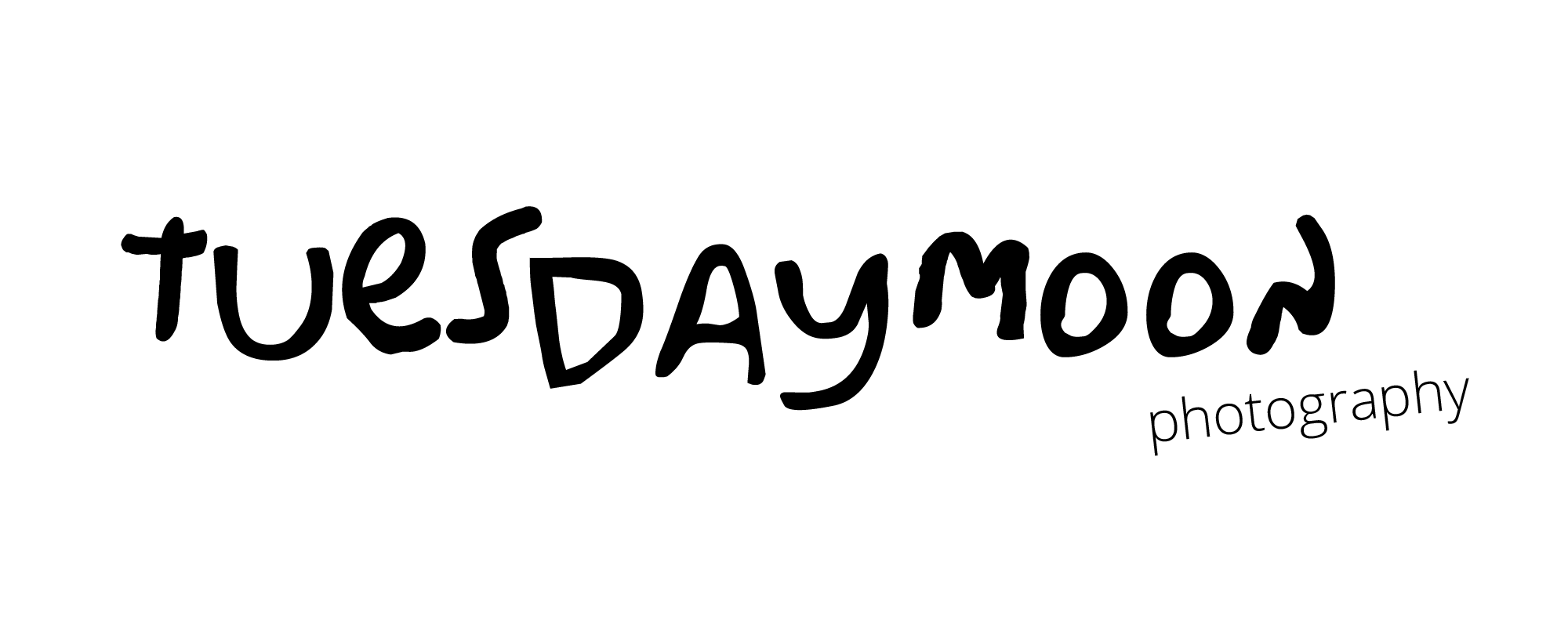오후 6시. 어느덧 거실의 8할은 어두움으로 들어찼다.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어느덧 한해의 끝이 눈 앞이다. 해가 짧아진 이유다. 앉아있던 거실 테이블에서 일어나 책장 위에 놓여진 작은 등을 하나만 켜둔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밝음에 너무 놀라서 긴 시간 찬찬히 이곳에 애써 발을 들여놓은 어둠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는 손에 집히는 앨범 하나를 들어 턴테이블에 올렸다. Adele의 첫번째 앨범이었다. 그녀의 음색은 슬프다. 그 가운데 평온은 없다. 그녀는 투사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지 않으려 밀어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상처가 없는 삶을 평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는 상처를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 맞서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한다.
“상처 받는 것이 싫어 숨어버린 그 곳은 평온이 아니다. 그러니 나와라”
그러나 철수야, 영희야 놀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권유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