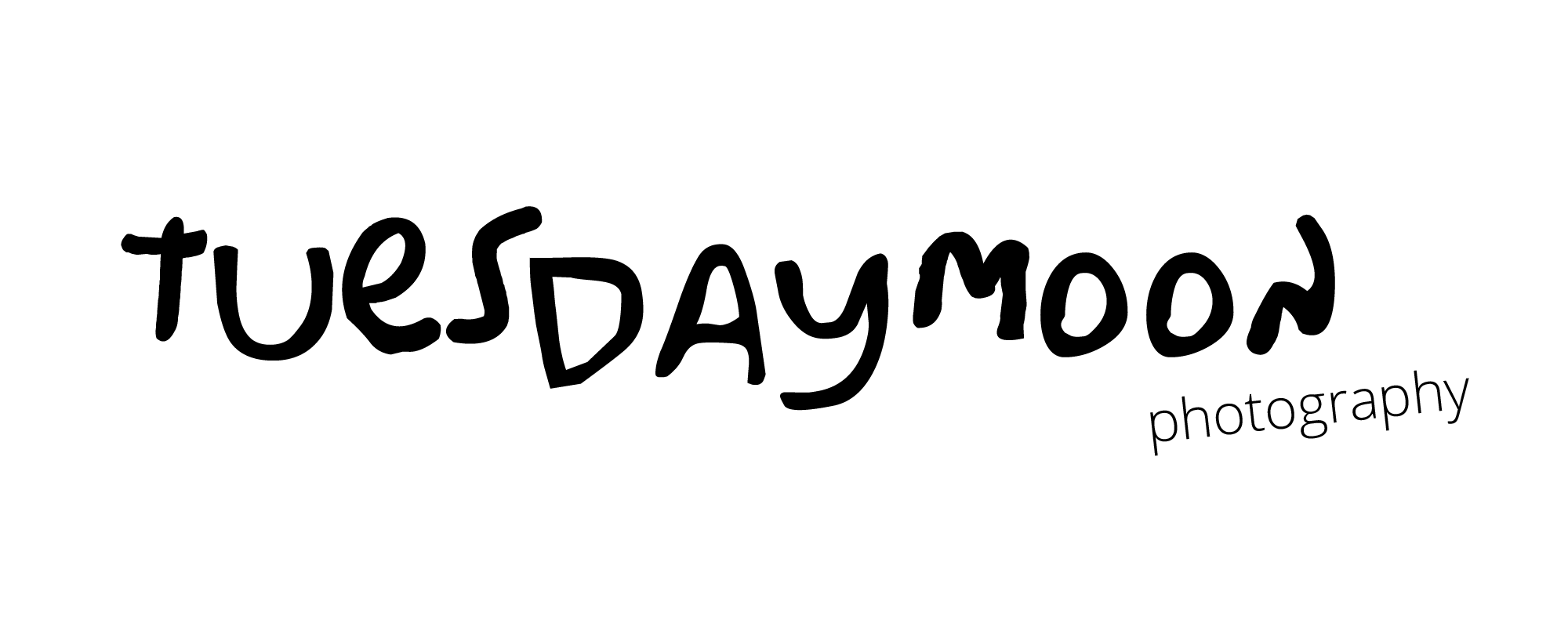5월 중국출장을 갔다가 미국에 들어오기전에 한국에 머물기로 하고 강남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렸다. 월요일 오후에 홍대쪽에서 술 약속이 있어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리움들이 묻어나는 것들 뿐이다. 2호선에 오르니 신입사원 시절 출퇴근 하던 기억도 새록하다. 홍대에서 신촌으로 다시 시청으로 시청에서 종로로 그리고 교대로 신천으로 건대로 하룻밤에도 무수하게 옮겨다니면서 친구들과 헤매이던 기억들이 눈에 선하다. 이런 저런 상념에 잡혀 손잡이를 붙잡고 지하철의 덜컹거리는 몸을 맡기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 앞이 밝아진다. 그리고 탁 트인 한강이 눈 앞에 펼쳐진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지금 보이던 그 풍경 그대로를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뉘엇지고 있는 해의살과 멀리 보이는 63빌딩이 거대함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낯익음으로 보이는 그 순간을 말이다. 친한 친구녀석과 고등학교때 대방역에서 내려 한강까지 걸어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한참을 무작정 뛰었던 기억이 있다. 추운 겨울이었다. 강둑에 앉아 한참을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었다. 우리 둘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 넓은 강을 앞에두고 앉아 서로에게 건낼 수 있는 말이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작은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이 그저 불안했던 시간들. 대학만이 눈 앞에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현실이고 정답이었던 시간, 그 시간들과 기억이 생각지도 않게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