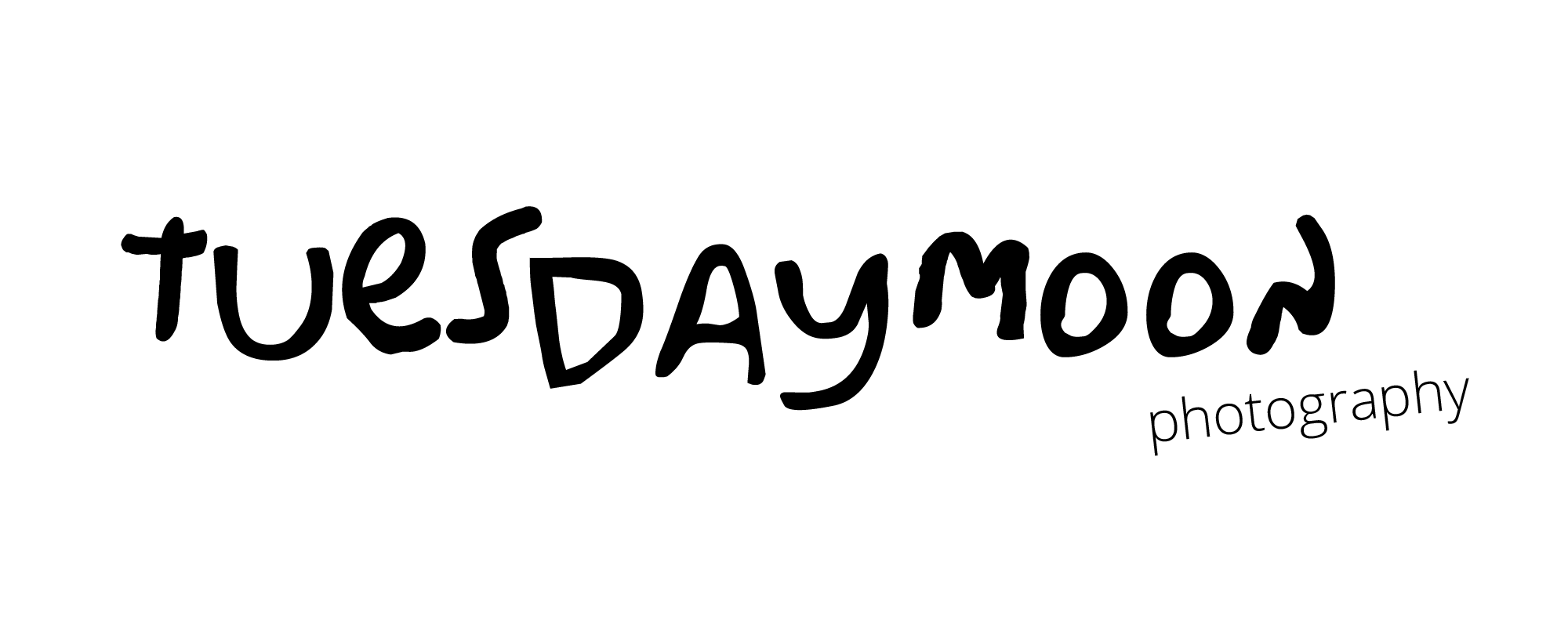湖里, 厦门 (2005)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알람을 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한다. 중국에서의 일은 보람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일이었다. 한국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경제 부흥의 시기를 서른살이 되던 해에 중국으로 오면서 산업 현장의 한켠에서 직접 겪어내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시계를 보니 출근 차량이 올 시간이 다 되어서 부랴부랴 아파트 로비로 나선다. 미지근한 커피 한잔을 들고 담배 한대 태우고 있으면 바랜 흰색의 출근 차량 밴이 도착한다. 먼저 타고 있던 직원들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칼을 흐트린채 차 안에서 잠에 들어있다. 자도 자도 잠이 모자란 청춘들이 아니던가 생각하며 피식 웃으며 조용히 차에 올라타 기사와 눈 인사만 나눈다.
차는 출발하고 나도 무거운 몸을 조수석에 깊게 묻고는 한 손에 작은 카메라를 쥐고 감길 듯 말 듯 졸리운 눈을 애써 버텨내고 앉아 있는다. 기사가 한참을 운전하다 내게 조용히 묻는다.
기사 : “왜 매일 이 지저분 하고 별 것도 없는 풍경들을 찍고 있는거야?”
나 : “글쎄…지금은 그냥 매일 보는 일상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라져버릴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봐, 지난달 까지는 있었던 저 찻집 건물이 이번주에 사라졌잖아. 나 그 찻집 좋아했다고.”
기사 :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봐봐 너무 촌스러워. 한국사람들은 다 세련되고 한국은 엄청 좋잖아? 우리도 빨리 새롭고 좋은 것들이 가득찼으면 좋겠어”
어쩌면 내 부모 세대들이 그들의 20~30대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장 또 성장,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부모들의 모습이 겹쳐졌었다.
중국이란 곳과 닿은 연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금 내가 촬영한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과 거리들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의 그 거리들이 아니다. 어떤 거리는 사라졌고, 어떤 마을은 옛 이름도 사라지고 40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그렇게 지금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들과 사람들로 가득해졌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아쉬움을 이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겠지,라고 생각하니 아직도 변화가 더딘 곳의 시간을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기도 한다.
<기억>이란 주제로 2005년에서 2007년 초반까지 중국에서 촬영이 된 사진들은 모두 패닝 기법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패닝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생동감 있게 촬영을 하는 기법으로 스포츠 경기 촬영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기법인데, 이 주제 촬영에서는 피사체도, 촬영자인 본인도 같이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사진 작업을 따로 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 중국에서 사는 동안, 출퇴근 차량에서 차창문을 통해 수년간 진행한 작업이었습니다. 본 작업의 사진은 Sony DSC T 시리즈로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