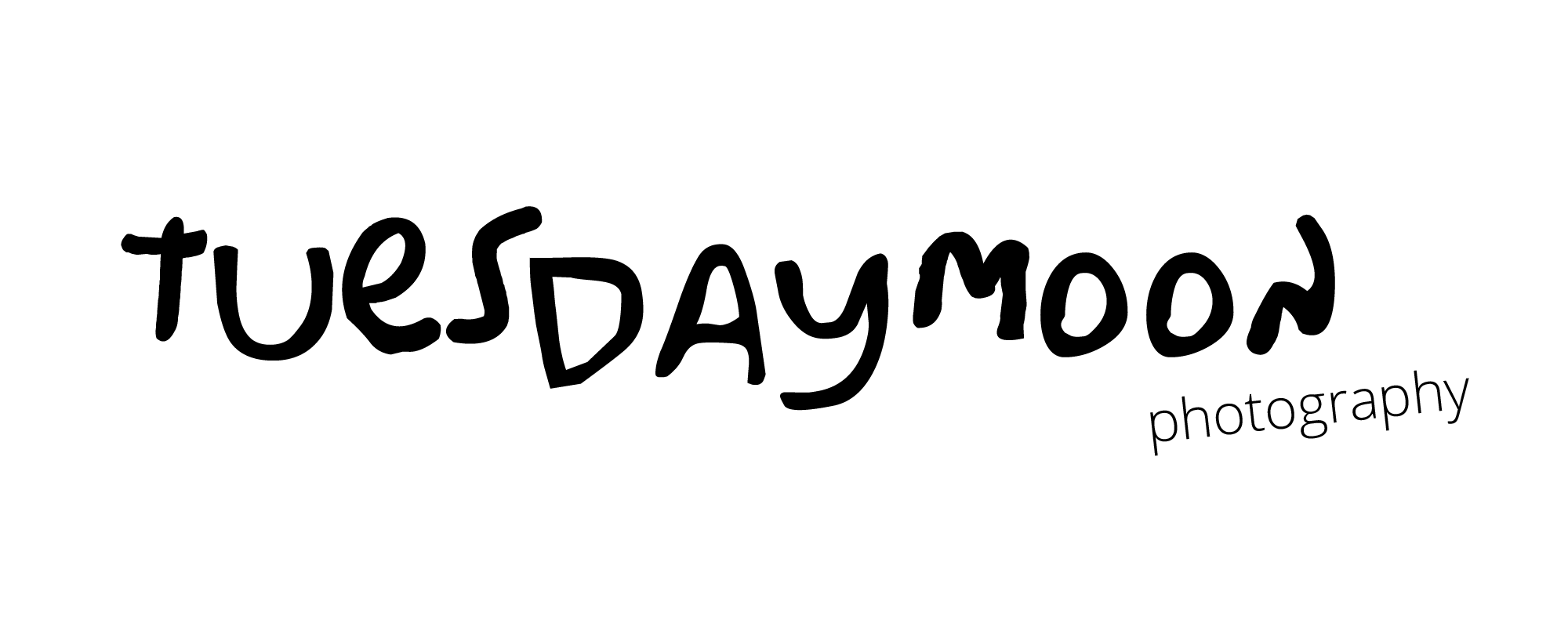중국으로 갔던 것이 2004년이니, 글을 쓰는 시점으로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모두가 2,30대 초반에 중국 남단의 작은 도시에서 만나 10년의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이젠 오랜 친구가 되어버린 옛 직장 중국 직원들과 거하게 술을 마셨다.
길고 흥겨웠던 술 자리를 끝내고 얼큰하게 취해 호텔로 돌아가던 늦은 밤, 장사를 마무리 하려던 노점 사장님을 애써 설득하고는 뜨끈한 소고기 국수를 주문하고 앉았다. 사장님은 무심하게 검정색 뚝배기 그릇을 꺼내어 삶아진 면을 올리고는 큰 냄비 뚜껑을 열어 밤새 끓고 있었을 마지막 육수를 휘휘 저어낸다.
추운 밤 공기 속으로 하얗게 퍼지는 육수 연기가 마치 꿈 같았다. 무뚝뚝한 인상의 사장님은 그 꿈 속 같은 하얀 연기가 듬뿍 담긴 뚝배기 그릇을 내 앞에 놓고는 돌아선다.
두손으로 조심히 그릇을 잡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니 “아…”하고 절로 뜨거운 탄성이 나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욕심이 하나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