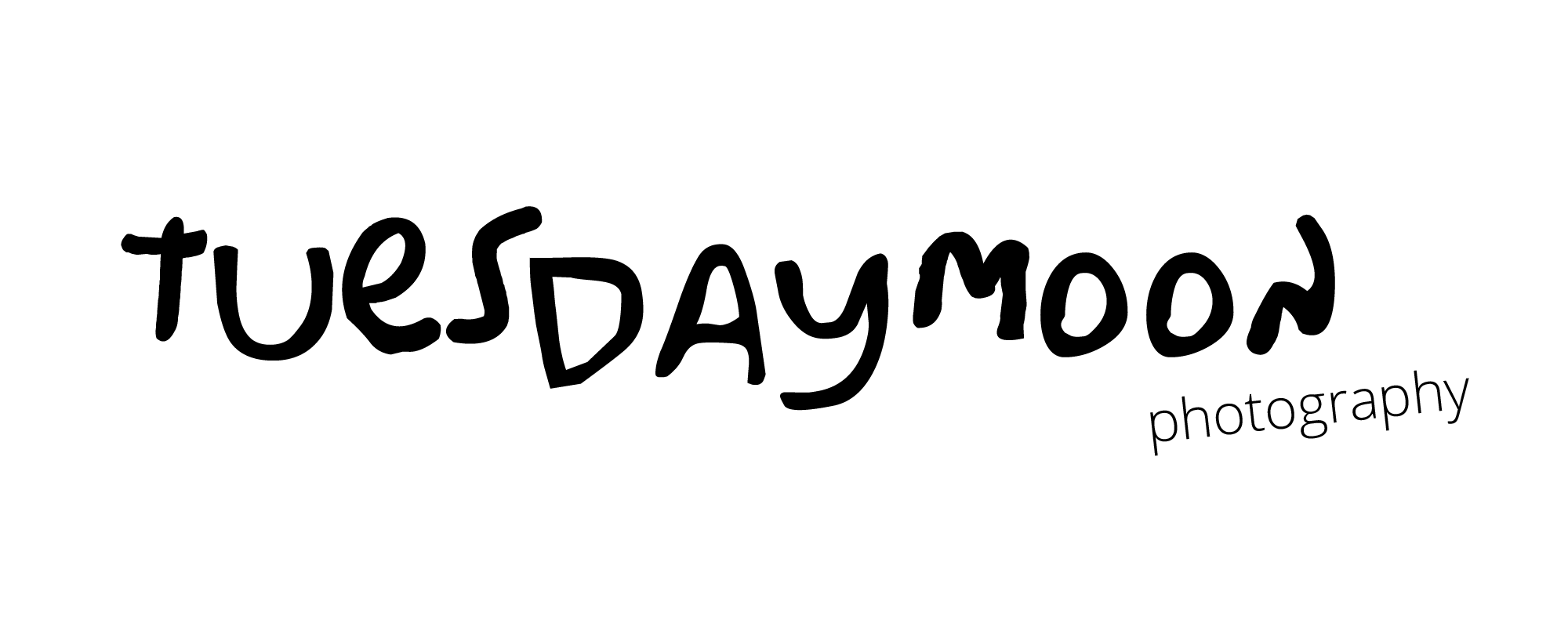70년대생인 나에겐 편의점과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더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언제나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각종 생선의 비릿한 냄새들과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든 많은 음식들의 냄새로 가득했던,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이 살아숨쉬던 곳이 바로 내가 기억하는 재래시장이다. 어릴적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들어서면 초입에 자리한 작은 좌판 순대집 할머니에게로 데리고 가서 따끈한 순대 한접시를 시켜주시고는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갔다. 순대집 할머니는 친손주를 대하듯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는 순대를 먹으면서 어머니의 부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냥 즐거워했다. 이런 일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시장 어느 길거리 좌판에 맡기고 편안하게 장을 보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면 느껴지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모처럼 광장시장을 찾았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재래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시장이다. 각종 먹거리가 가득한 좌판과 식당이 가득하게 존재하는 시장이다. 어떤 모습의 시장이건 이런 재래시장에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그 강한 에너지는 사람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 당기고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에너지다. 그것이 바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타인을 향한 ‘포용’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포용’이 사람들을, 나를 계속하여 이런 시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음이 분명해보인다.
가끔 나태해지거나 머리가 복잡해지면 재래시장을 찾곤 했다.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사치(?)를 누리기가 어려워졌지만, 한국에 나가면 꼭 찾는 곳 중에 하나다. 이런 재래시장들이 활발해져 우리내의 삶에 윤택함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좋아하는 동무들과 저 시장의 한켠에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빈대떡에 술잔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글을 쓰는 내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