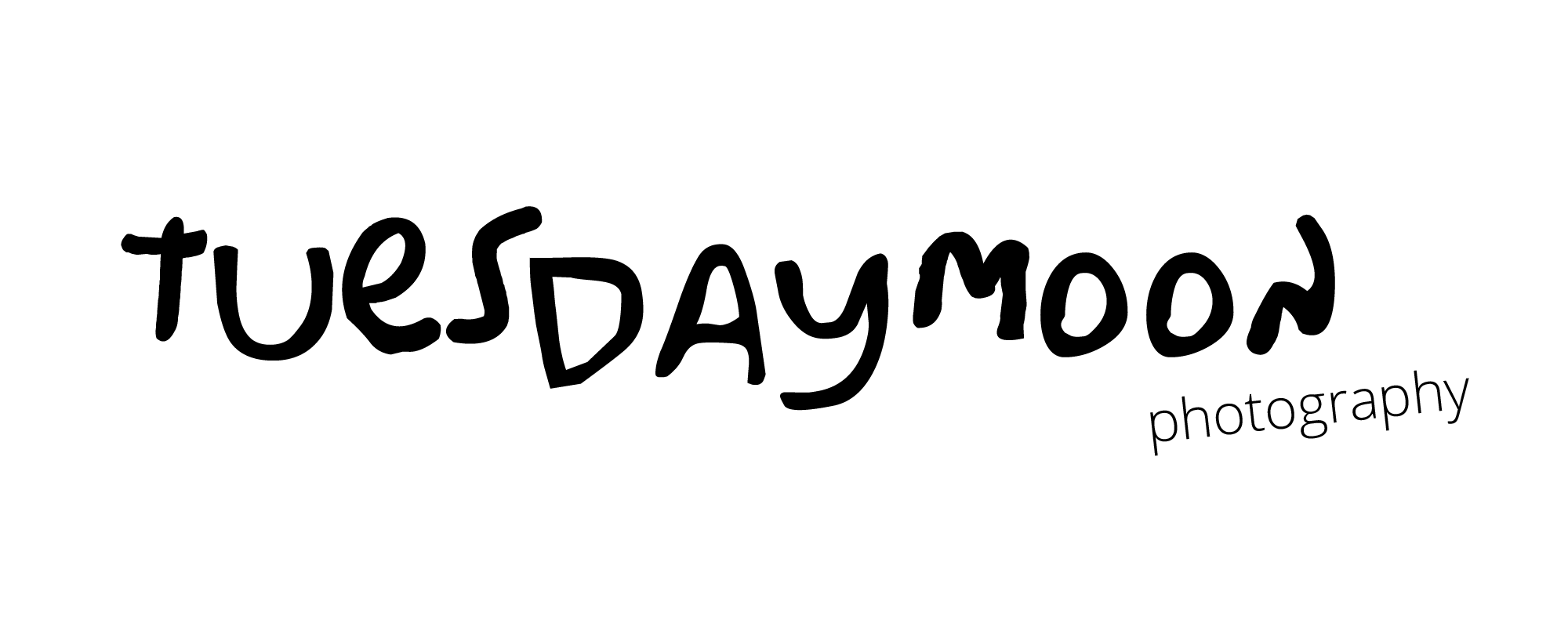감기약을 먹고는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몇시간이나 잔 것일까, 눈을 뜨니 사방이 온통 깜깜하다. 손을 뻗어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램프를 켰다. 갑자기 밝아진 조명덕에 눈이 찌푸려진다. 전화기를 들어 메일을 확인하고 목상태가 어떤지 침을 삼켜본다. 다행히 목넘김때 있던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물을 마시고 싶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다 마치 세상 모든 밝음이 내 발 아래에만 있는 것 같아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불 하나를 환하게 밝힌다고, 모든 구석 구석을 다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불 가까이 환하게 밝혀진 곳, 그 안에서도 명암은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곳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생각이야 기특하지만, 불 하나에만 의존하여 곳곳을 밝혀내려 한다면 그 하나의 불에 모든 역량이 집중 되어야 하고, 역량이 집중이 된다고 해도 그 불에 가까운 곳만 더욱 더 환해질 뿐, 불과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그 명암의 차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곳곳을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 불 하나를 거대하게 키울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밝기를 가진 작은 불을 서로의 손에 들리게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짧은 이명이 시작되었다가 멈췄다.
어릴때는 이명이 신이 내게 보내는 텔레파시라고 생각을 했었다. 아마, 내 중얼거림에 신이 화답을 한 것이겠다 싶었다.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셨다.
2015년의 두번째 날이 지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