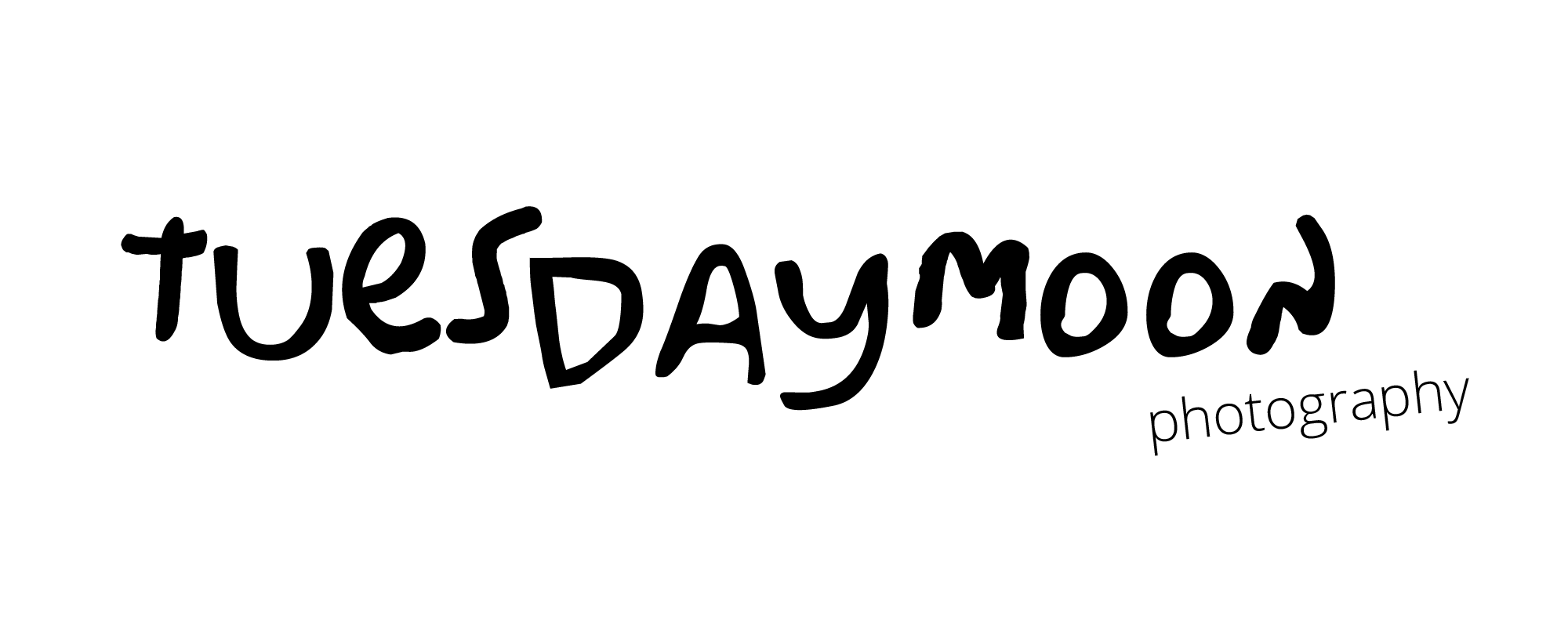사진을 너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는 강박까지 생겨서, 손에 카메라가 없으면 심리상태가 불안할 정도였는데, 사진에 빠져서 지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사진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전의 세상과는 달라져갔다. 매일 다니던 길도, 수없이 지나쳤던 버스 정류장도 매일매일이 다르게 보였다.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은 그렇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건네어준 행복이자, 그 시선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적 강박을 만들어준 애증이었다. 그럼에도 꽤나 긴 시간을 수없이 많은 거리를 걸었고, 그 거리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찍고 풍경을 찍었다. 그 덕에 그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사계절 속의 빛과 각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또 여러 환경의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내게 빛은 그 빛이 그저 눈부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피사체를 만나 투영되어 나타나는 이미지가 내겐 가장 아름다웠었다. 반투명한 PVC 슬레이트 지붕에 얹혀진 빛이 그랬고, 빨랫줄에 널어 놓은 침대보가 바람에 날리며 쳐내던 빛이 그랬고, 잠시 스치듯 반짝이던 친구의 안경테에 닿은 빛이 그랬었다. 그러한 빛들은 그저 눈부심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앉아주고, 우리를 향해 반갑게 내어주는 손짓이었다. 한참을 걷다가 지친 발을 쉬일 겸 털썩 주저앉는 골목 어귀에서도,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붕에 오랜 시간 다른 색으로 걸쳐져 있기도 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며 내 눈앞에 기억되던 모든 빛들은 자연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사람과 함께 만들어낸 빛이어서 더욱 좋았었다.
책상 정리를 하다, 우연히 찾은 낡은 USB를 들여다보다 찾은 15년 전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며, 그 시절 바라보았던 빛들을 떠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