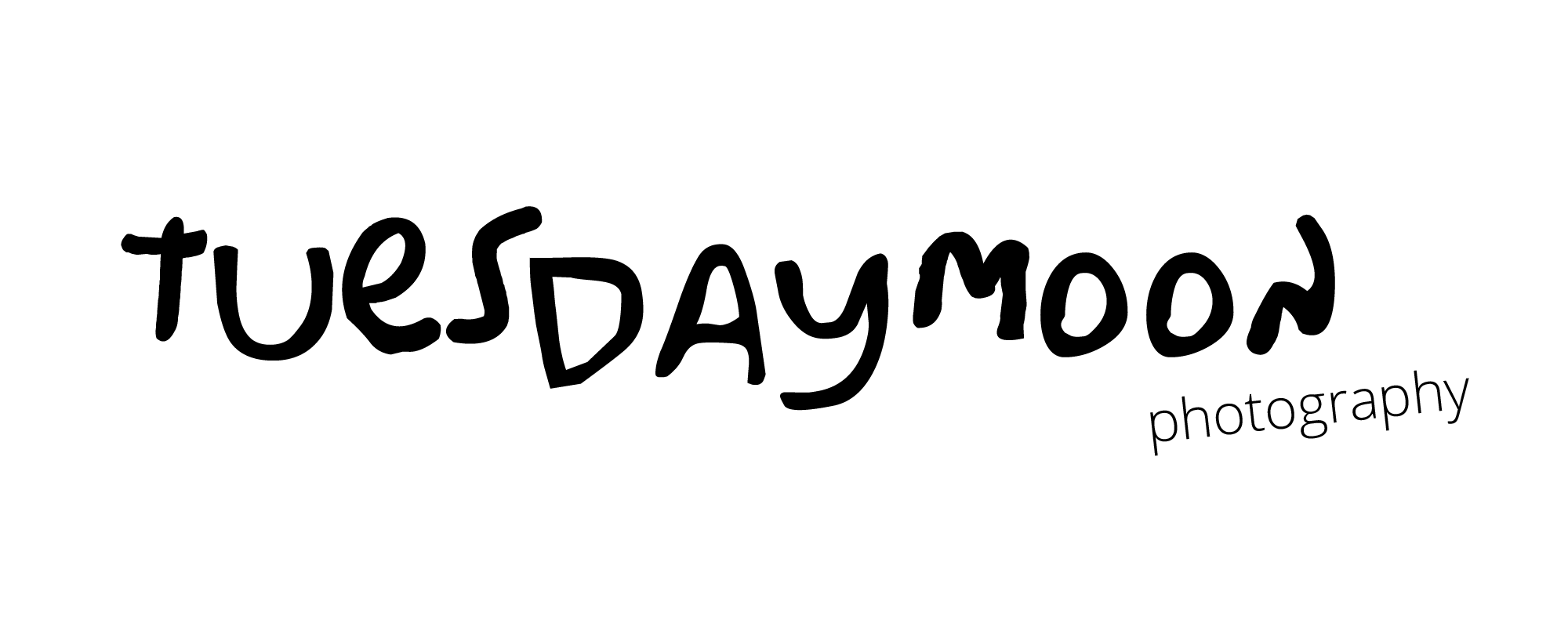바로셀로나에 대해 내가 가진 이미지를 떠올리자면, 그 유명한 가우디도, 피카소도 아니고 집시들의 한이 가득한 플라멩고도 아니다. 이 사진 속 두 남성이 오손도손 앉아 있는 저 골목길 한켠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젠 우리에게 추억으로만 자리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살아 있는 골목이었다. 미로 같은 골목길 속에 자리한 사람들과 사람들의 연결된 삶들이 얼마나 정겹고 좋았는지, 그 첫번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다섯차례를 방문할 만큼 매년 나는 그 모습을 그리워했다.
이 도시로의 여행은 무엇을 꼭 봐야한다는 목적성은 완전 결여가 된, 그저 가능한 모든 골목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그 곳을 걷고 또 걷는다. 그러다보면 관광지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골목길에서 만나는 곳들은 대부분 영어는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 하나 주문을 하기 위해 손짓 발짓을 하다가 끝내 서로 웃음이 터지는 정겨운 일도 겪게 된다.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것이 벌써 15년이 되어간다. 중국에서 살았을때 보다 상대적으로 이곳 미국에서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터득하는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외국인에 대한 관대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보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이 쉽게 그리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인간적 관계성이 비교적 많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긴 미국이고 영어가 국어다. 아쉬운 너가 배워라’라는 뉘앙스의 느낌이 미국에선 강하다면, 중국이나 바로셀로나에서는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네.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편안한 시선과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3년을 살면서 하게 된 중국어는 수준이 높지는 않아도 일상과 업무에서의 기본적인 소통은 중국을 떠난지 10년이 된 지금도 가능하다. 모르긴 해도 10여년을 바로셀로나에서 살았다면, 아마 스페니쉬는 물론 카탈루냐 말도 유창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도 그렇다.
칼 바람이 거리를 감싸고 오후 5시면 어두워지는 11월의 뉴욕 거리에서 담배 한대 태우다, 문득 그 골목길을 걷던 시간을 기억한다.